[최보윤 기자의 럭셔리 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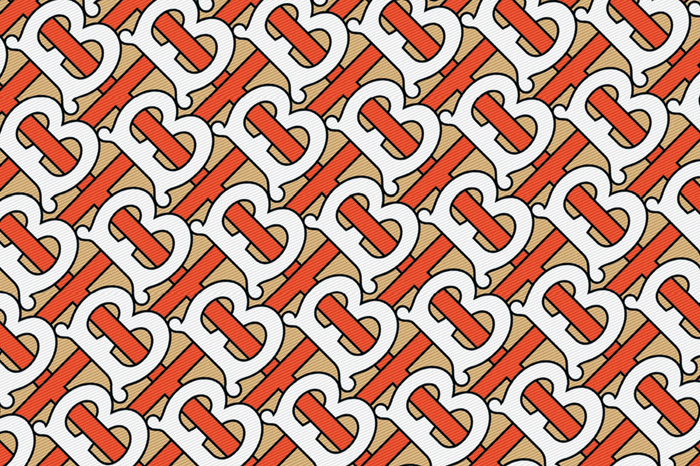
지난 9월 한 달간 뉴욕·런던·밀라노·파리를 달구며 치열하게 펼쳐지던 4대 패션위크가 최근 막을 내렸다. 현혹할 정도로 화려한 런웨이 사진들이 쏟아지고, 그 어느 때보다 프레스와 바이어의 손길이 바빠지는 때이기도 하다. 30분이 채 안 되는 런웨이는 그야말로 전쟁터다. 옷을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 막판까지 몸매와 걸음걸이를 가다듬는 톱 모델들과 한 시즌 유행을 주도하는 헤어 메이크업은 기본. 고급 원단과 감각적인 디자인, 화려한 보석들과 지갑이 마구 열릴 것 같은 가방들, 아찔한 하이힐이 런웨이를 뒤덮는 동안 보는 이는 마치 딴 세상에 있는 듯한 마법에 걸린다. 누군가에겐 단순히 호화나 사치로 보일진 몰라도, 디자이너와 브랜드의 명운이 갈리는 잔혹한 시간이기도 하다.
이번 시즌 패션위크는 세계적으로 마니아 팬층을 몰고 다니는 디자이너의 컴백으로 패션계 관계자들을 들뜨게 했다. 대표적인 것이 전통의 브랜드 버버리를 새롭게 짊어질 리카르도 티시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방시를 12년간이나 지배하다 런던에서 심기일전하게 된 티시가 브랜드에 어떤 혁신과 파괴로 신선한 숨결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뉴스'를 만들어낼 가치가 있다는 건 쳇바퀴 돌듯 비슷해만 보이는 패션계에 에너지를 주기도 한다. 럭셔리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스트리트 디자인을 시도해 '패션계 디스럽터(disrupter)'로 불리는 티시다. 악동 느낌이 강했던 킴 카다시안과 카녜 웨스트의 결혼식 웨딩드레스를 맡아 섹시한 우아함을 수혈하기도 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보란 듯이 브랜드 로고부터 바꿔버렸다. 토머스 버버리의 T와 B를 따 실이 서로 엮인 듯 재배치하고 베이지와 주홍색으로 상큼함을 더했다는 호평을 대거 얻어냈다. 스트리트 브랜드가 하듯 쇼가 끝나자마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부 상품을 즉시 팔겠다는 방식도 화제성 있을 만했다.
드디어 브랜드를 덮었던 장막이 걷히고 베이지 빛 버버리 전통을 상징하는 트렌치코트의 물결이 런웨이를 수놓았다. 17년간 버버리 디자이너를 맡으며 CEO 역할까지 세련되게 짊어진 크리스토퍼 베일리가 일궈놓은 혁신이 대단했기에 티시에 대한 비평가들의 날카로운 눈매는 디테일 하나하나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영국 가디언은 '뉴 버버리'에 대해 "신선한 출발"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올렸다. 티셔츠와 스웨트 셔츠 등 스트리트 웨어를 럭셔리 브랜드로 격상시킨 티시이기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평이었다. GQ 디렉터 역시 "미학적 감수성이 돋보인다"고 티시를 치켜세웠다.
하지만 평단의 반색과 호평과는 달리 소비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새로울 게 없다는 것이다. 유명 패션 커뮤니티에선 "지방시에서 보여줬던 스타일의 변주"라는 반응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은 오히려 찬물을 끼얹은 듯하다. 평단에서 품격을 높였다며 입 마르게 칭찬했던 그 스타일이었건만 JP 모건 등 금융가에선 오히려 고객 취향을 혼란하게 했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지난달 14일 주당 2153파운드에 거래되던 주가는 패션쇼 이후 떨어져 20일 1977파운드로 하락하더니 지난 9일 종가 기준 1864.49파운드까지 급락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버버리의 '큰손'인 중국 시장이 씀씀이에 고삐를 죄고 지갑을 닫으면서 버버리의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고객의 미온적인 반응에 주목했다. 엘르 매거진의 파란 크렌칠 디렉터는 버버리 쇼 뒤 "버버리에 새 정권이 들어섰다는 가장 명징한 신호는 런웨이가 아닌 프런트로(frotrow·유명 스타들이 차지하는 맨 앞줄)"라며 "스타들로 가득했던 베일리에 비해 티시에게선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적었다. 혁신가 티시의 마법은 언제쯤 시장까지 매혹시킬 수 있을까. 그에게 '반짝이는 것'이란 거리가 먼 걸까. 스타도, 돈도 아직은 그의 편이 아닌가 보다.
이번 시즌 패션위크는 세계적으로 마니아 팬층을 몰고 다니는 디자이너의 컴백으로 패션계 관계자들을 들뜨게 했다. 대표적인 것이 전통의 브랜드 버버리를 새롭게 짊어질 리카르도 티시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방시를 12년간이나 지배하다 런던에서 심기일전하게 된 티시가 브랜드에 어떤 혁신과 파괴로 신선한 숨결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뉴스'를 만들어낼 가치가 있다는 건 쳇바퀴 돌듯 비슷해만 보이는 패션계에 에너지를 주기도 한다. 럭셔리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스트리트 디자인을 시도해 '패션계 디스럽터(disrupter)'로 불리는 티시다. 악동 느낌이 강했던 킴 카다시안과 카녜 웨스트의 결혼식 웨딩드레스를 맡아 섹시한 우아함을 수혈하기도 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보란 듯이 브랜드 로고부터 바꿔버렸다. 토머스 버버리의 T와 B를 따 실이 서로 엮인 듯 재배치하고 베이지와 주홍색으로 상큼함을 더했다는 호평을 대거 얻어냈다. 스트리트 브랜드가 하듯 쇼가 끝나자마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부 상품을 즉시 팔겠다는 방식도 화제성 있을 만했다.
드디어 브랜드를 덮었던 장막이 걷히고 베이지 빛 버버리 전통을 상징하는 트렌치코트의 물결이 런웨이를 수놓았다. 17년간 버버리 디자이너를 맡으며 CEO 역할까지 세련되게 짊어진 크리스토퍼 베일리가 일궈놓은 혁신이 대단했기에 티시에 대한 비평가들의 날카로운 눈매는 디테일 하나하나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영국 가디언은 '뉴 버버리'에 대해 "신선한 출발"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올렸다. 티셔츠와 스웨트 셔츠 등 스트리트 웨어를 럭셔리 브랜드로 격상시킨 티시이기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평이었다. GQ 디렉터 역시 "미학적 감수성이 돋보인다"고 티시를 치켜세웠다.
하지만 평단의 반색과 호평과는 달리 소비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새로울 게 없다는 것이다. 유명 패션 커뮤니티에선 "지방시에서 보여줬던 스타일의 변주"라는 반응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은 오히려 찬물을 끼얹은 듯하다. 평단에서 품격을 높였다며 입 마르게 칭찬했던 그 스타일이었건만 JP 모건 등 금융가에선 오히려 고객 취향을 혼란하게 했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지난달 14일 주당 2153파운드에 거래되던 주가는 패션쇼 이후 떨어져 20일 1977파운드로 하락하더니 지난 9일 종가 기준 1864.49파운드까지 급락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버버리의 '큰손'인 중국 시장이 씀씀이에 고삐를 죄고 지갑을 닫으면서 버버리의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고객의 미온적인 반응에 주목했다. 엘르 매거진의 파란 크렌칠 디렉터는 버버리 쇼 뒤 "버버리에 새 정권이 들어섰다는 가장 명징한 신호는 런웨이가 아닌 프런트로(frotrow·유명 스타들이 차지하는 맨 앞줄)"라며 "스타들로 가득했던 베일리에 비해 티시에게선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적었다. 혁신가 티시의 마법은 언제쯤 시장까지 매혹시킬 수 있을까. 그에게 '반짝이는 것'이란 거리가 먼 걸까. 스타도, 돈도 아직은 그의 편이 아닌가 보다.